|
“그 X간나새끼”
악인의 최후는 짧았다. 조선인도, 그렇다고 일본인도 아닌 어차피 버려질 운명. 그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보다 살아서 배를 채우기를 택했다. 부(富)는 그의 목숨과도 같았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완익(김의성)은 함경도에서 소작농의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누나 둘과 동생 하나가 굶어 죽었다. 소작 붙이던 손바닥만한 땅은 빼앗겼다. 그는 누이를 지주의 소실로 보내고 받은 돈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머리가 좋았다. 수년간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미국 제독의 통변을 맡았다. 거대한 함선에서 바라본 조선은 초라했다. 스러져가는 하현달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나라가 결국 거대한 야욕에 무너지리라고. 살자면 강한 자의 편에 서야 했다.
그는 일본을 택했다. 조선의 위기는 곧 자신의 기회로 직결됐다. 영어와 일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인에게 엄청난 힘이었다. 말로 기세를 잡은 그는 말로 나라를 유린했다.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였다. 일본은 그 없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고,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
착각이었다. 일본은 목적의 9부능선을 넘어서자 가차없이 그를 버렸다. 한일의정서가 준비된 후 그는 필요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깟 의병이 그리 대단했으면 내가 살아있겠냐”며 허세를 부리는 그에게 모리 다카시(김남희)는 말한다. “그래서 문제”라고. “의병들은 매국노 하나 처리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모리 타카시는 지금부터 정신을 훼손해야 한다고,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해야 한다고 이완익을 몰아쳤다. 그는 뚱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민족성이란 본 적도, 들은적도 없는 말이었다. 임진년 의병의 자식이 을미년 의병이 되고, 그 자식이 또 의병이 된다는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이야기던가.
그렇게 그는 의병의 자식에게 죽었다. 총성 두 번이면 됐다. 질질 끌지도 않았다. 고애신(김태리)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발, “간나새끼”하며 또 한발. 매국의 삶은 끈질긴 영광을 가져왔으나 죽음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조선도 일본도 그를 버렸다.
모리 타카시의 등장부터 그의 죽음은 예고돼 있었을지 모른다. 진짜 적은 누구인가. 매국노인가, 매국노를 만든 그들인가. 나무 뒤에 보이는 더 큰 나무, 그리고 더 큰 나무, 그리고 숲. 의병들이 막아내야할 대상은 결국 나무가 울창한 숲이었다. 이완익이, 모리 다카시가, 절에 밀려들어온 일개 분대의 군인이 아니라 새카맣게 밀려들어오는 일본 정규군이었다.
|
매국노 한명의 움직임은 매국의 통로만 열었을 뿐이었다. 이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이들이 있었다. 끝도 없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의병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막막하고 끝없는 싸움에 의병들은 던져졌다. 비가 오면 쓸 수 없는 화승총, 정식 교육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소시민, 이들의 투쟁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분노를 단전에서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더 큰 적이 온다. 만만치, 아니 절대 열세다. 그래도 이들은 총을 든다. 빵집주인도, 도공도, 노비도, 애기씨도 그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하나가 된다. 건, 글로리, 그리고 새드엔딩. 이제부터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다고 조선이 구해지냐고.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지.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것일 뿐.
|
/최상진기자 sestar@s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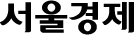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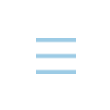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최상진칼럼]'미스터션샤인③' 이완익은 왜 일찍 퇴장했나](https://newsimg.sedaily.com/2018/09/11/1S4LF53T6O_5.jpg)
![[최상진칼럼]'미스터션샤인③' 이완익은 왜 일찍 퇴장했나](https://newsimg.sedaily.com/2018/09/11/1S4LF53T6O_6.jpg)
![[최상진칼럼]'미스터션샤인③' 이완익은 왜 일찍 퇴장했나](https://newsimg.sedaily.com/2018/09/11/1S4LF53T6O_7.jpg)
![[최상진칼럼]'미스터션샤인③' 이완익은 왜 일찍 퇴장했나](https://newsimg.sedaily.com/2018/09/11/1S4LF53T6O_8.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