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옥스퍼드를 기억하게 하는 공간은 강의동이 아니라 건물 중간의 뜰입니다.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공간들이 건축물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이곳에서 공동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얼핏 보면 쓸모가 없는 공간을 중시한다.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치퍼필드가 계획설계와 개념설계를 맡았으며 윤세한 해안건축 대표가 실시설계를 담당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 설계 역시 이 같은 치퍼필드의 공간에 대한 철학이 반영됐다. 가로세로 100m에 이르는 1층의 회랑, 거대한 아트리움, 그리고 건물 중간중간의 루프가든 등은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바로 이 공간들이 옥스퍼드의 뜰처럼 아모레퍼시픽 사옥 하면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공간들이다. 치퍼필드는 “현대 건축에서는 이런 ‘쓸모없는’ 공간은 퇴출되고 마지막 1㎡조차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가치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적인 정신이 충만한 사적인 건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주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덕이라고 두 건축가는 입을 모았다. 서 회장은 사옥 현상설계 전부터 전 세계 후보 건축가들을 직접 만나 교감했다. 치퍼필드는 서 회장이 다른 의뢰인과는 너무나 달랐다고 했다. 그는 “서 회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들은 ‘가급적 빨리 지어서 키를 넘겨달라’는 식이다. 결과에 신경을 쓴다. 그런데 서 회장은 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즐겼다. 사옥 건축이 기업의 비전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뢰인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건물의 형태도 바뀌었다. 첫 구상은 두 동짜리 타워형 건물이었으나 사회와의 ‘연결성’이라는 서 회장이 제시한 화두에 부합하는 형태를 찾다 보니 박스 형태로 발전시켰다. “의뢰인의 요구가 명확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을 담아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마을’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면과의 점접을 줄이고 위로 뽑아 올린 타워형 건물은 효율은 좋지만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아 박스 모양을 생각해냈습니다.”
2012년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기도 했던 치퍼필드의 대표작으로는 베를린의 노이에스뮤지엄(신박물관), 바르셀로나의 시티오브저스티스 등이 꼽힌다. 그는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는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한국에서 지은 작품은 많지만 이를 자신의 대표작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치퍼필드는 최초의 설계 콘셉트가 끝까지 유지되고 완성도 있게 구현된데 크게 만족스러워했다. 이 과정에서 실시설계와 디자인 감리, 인허가를 맡은 해안건축의 역할이 중요했다. 윤세한 해안건축 대표는 “처음부터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 기본설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검증과 대안제시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게 실시설계안을 만들어나갔다”며 “시공 기간 내내 현장에 디자인 감리로 상주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아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대규모의 노출 콘크리트로 공간을 구현하고 건물 중간중간 옥상 가든을 마련하는 등 국내의 일반적인 설계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건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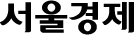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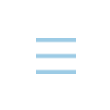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건축과도시]''쓸모없는 공간'이 건축물 정체성 만들어'](https://newsimg.sedaily.com/2018/10/10/1S5UYKP92T_1.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