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3.jpg) | 벌스하우스의 ‘플라워월’. /김나영기자 |
|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4.jpg) | 벌스하우스의 대표 작품인 ‘플라워월’. /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고 보여주는 집이 있다. 서울 연남동 끝자락에 자리잡은 플랜테리어 스튜디오 벌스하우스(VER‘S HOUSE)다. 수십여종의 드라이플라워와 살아있는 이끼가 모여, 마당 있는 2층집 벽면이 ’꽃밭(플라워월)‘이 됐다. 말린 지 무려 3년된 꽃들이 대부분이다.
꽃벽을 만든 주인공은 벌스 대표 김성수(37). 김 대표는 ‘꽃은 금방 시들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을 뒤집고 싶어서 3년전 가드닝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3일 벌스하우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식물은 살아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는다고 했다. “길가에 있던 팬지화단을 새벽에 다 갈아엎는 걸 봤다. 멀쩡한 꽃을 다 죽이고 있더라. 그저 바꿀 때가 됐다는 이유였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식물을 살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식물은 보는 즐거움보다 키우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동물처럼 식물도 반려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꿈을 내비쳤다.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5.jpg) | 김성수 대표. |
|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6.jpg) | 연남동 경의선숲길 끝자락에 자리잡은 벌스하우스. /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7.jpg) | 벌스하우스의 대표 작품인 ‘플라워월’./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가드닝과 겨울은 쉽지 않은 조합이다.
“맞다. 겨울은 참 춥다(웃음). 일단 밖에 심었던걸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추위에 못 이기는 식물이 너무 많다. 잘못하면 다 말라죽는다. 벌스하우스 마당에 심었던 식물들은 사철나무를 제외하곤 전부 실내로 옮겼다. 그래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은 관리가 쉬운 편이다. 무조건 그렇게 골랐다. 손님이 키우기 쉬운 식물만 데려다 놓자고 그게 우리 철칙이다.”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8.jpg) | 기존 집의 화장실은 B-room으로 탄생했다. 습기에 강하고 빛이 잘 들지 않아도 살수있는 식물을 주로 배치했다./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1.jpg) | 벌스하우스 ‘A-Room’은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꽃구름’으로 뒤덮여있다. /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 예쁜 것 뿐만 아니라 키우기 쉬운 식물만 골랐다는 게 독특하다.
“식물이 살아있다는 건 당연한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실을 잊는다. 잠깐 보기 위해서 식물을 데려다 놓는다는 게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데 가만 보면 키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 ‘물은 1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한 달에 한 번만 주세요.’ 이런 식이다. 그런 공식이 어딨나. 하물며 집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어디에 놓고 키울 생각인지도 묻지 않는다. 일단 꽃이나 식물을 사겠다는 손님이 있으면 어디서 키우실 건지, 어떤 환경인지부터 물어야 된다. 벌스는 식물을 파는게 아니라 ‘반려식물’을 분양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여행갈 때 관리가 안되면 맡기고 가는 분들도 있다. 꽃다발 구매하면 드라이하는 법까지 알려준다. 만약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도 반려식물이 죽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주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무료분양을 해준다. 가끔 ‘선인장도 죽여서 못 키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 부모님이 꽃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식물과 자라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부모님이 남대문 꽃도매 시장에서 32년째 일하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 식물은 내 인생의 일부다. 어렸을 때 완두콩을 선물 받았는데 하트 모양 싹이 나오고 줄기가 늘어지기 시작했다. 그걸 마당에 분갈이해서 심었는데 열매가 열릴 때까지 키웠다. 완두콩 다섯 알이 나와서 엄마·아빠·누나랑 같이 나눠먹었다. 처음 키우는 재미를 느낀 건 그때부터다. 사실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 사업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공부는 뮤지컬·영화 쪽으로 했고 사회생활은 패션 쪽에서 했다. 부모님 일은 돕는 정도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에서 경험했다. 일본 도쿄에 하타가야라는 동네가 있는데 집집마다 정원이 있었다. 색이 제각각인데 너무 예뻤다. 식물과 어우러져서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3년전 연남동 초입에 자리잡은 것도 하타가야의 분위기와 닮아서다.”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2.jpg) | 벌스하우스 1층 전경./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3.jpg) | 벌스하우스 2층의 다이닝룸. /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 ‘벌스’라는 이름이 특이하다. 무슨 뜻인가.
“처음 회사명은 ‘드라이벌스가든’으로 지었다. 택시운전자가 목적지로 데려다 주듯, 식물과 꽃을 제대로 접한 적 없는 손님들에게 쉽고 빠르게 식물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 드라이플라워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부르다 보니 이름이 너무 긴 탓에 벌스로 줄여서 부르게 됐다. 2015년 9월 1일 연남동 초입에 꽃집 겸 카페 ‘벌스가든’으로 시작했다. 올해 3월 경의선 숲길 끝자락에 2층 집을 개조해 ‘벌스하우스’로 확장 이전했다. 확장하며 꽃집, 카페, 가드닝 섹션으로 구분했다.”
△ 꽃집 겸 카페였던 ‘벌스가든’에서 ‘벌스하우스’로 확장했다. 카페를 파는 꽃집이 컨셉이었는데 사실 카페가 더 잘됐다.
“맞다. 처음 컨셉은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거 였다. 그런데 안되더라. SNS 사진 찍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출로 따지면 카페가 7, 꽃이 3이다. 벌스하우스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4.jpg) | 벌스하우스 내에 위치한 꽃집. /사진제공=벌스하우스 |
|
△ 그런데도 ‘벌스하우스’엔 꽃집이 따로 있다.
“꽃집을 만들면서 목적성이 분명해졌다. 커피 마시러 왔다가 꽃 사는 손님은 별로 없는데 꽃 사러 왔다가 커피 마시는 손님은 많아졌다고 보면 된다. ‘벌스하우스’로 공간을 늘린 이유는 식물이 집이라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손님이 ‘우리 집’에 식물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까 그리는 그런 밑그림이 필요했는데, 여긴 마당 있는 2층집이라 그 조건에 잘 맞았다. 집의 뼈대를 그대로 두고 각 공간에 맞는 식물들을 배치했다. 화장실은 습하고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을 두는 식으로 꾸몄다.”
△ ‘집집마다 반려식물 키우기’가 벌스의 목표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러려면 접근성이 중요하다. 꽃집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쉽게 반려식물을 가져갈 수 있게 온라인 채널을 고민 중이다. 오래가고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들도 더 많이 찾고 있다. 결국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아름다움과 감성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 위로 받는 목적이 크지 않나. 위로 받고 싶은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하고 싶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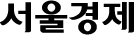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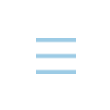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3.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4.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5.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6.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7.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8.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19.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0.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1.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2.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3.jpg)
![[디자인의 재발견] '꽃은 죽어야 오래 산다' 벌스하우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8/1S8DVJ14XF_24.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