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이 대기업의 출점 제한을 법적으로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후 첫 사례다. 음식점은 대기업과 대립 보다 상생을 통해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31일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음식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외식업중앙회와 같이 업종 대표 단체가 신청하고 동반위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중기부가 최종 승인한다. 외식업중앙회는 40여만개 음식점이 가입한 음식점업 대표 단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의 중기 적합업종처럼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다. 하지만 권고 수준이였던 중기 적합업종 보다 규제 강도가 세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이날 기준 제과점업, 서점 등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1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음식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는다. 상생협약은 중기 적합업종에 준하는 안이 담겨있다. 또 대기업-동반위-외식업중앙회가 상생협의체를 만든다. 협의체는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판단하고 조건 완화를 검토한다.
음식점업이 상생을 선택한 이유는 대기업과 대립이 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 대기업이 권고를 너무 잘 준수해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분위기가 컸다”며 “경영난은 대기업 문제 보다 우리 스스로 조리, 위생, 마케팅 등의 문제가 아닌가란 자성의 목소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음식점업의 이번 결정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이 제도는 골목상권 보호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일반 국민의 소비권을 뺏고 내수시장과 업체의 경쟁력을 낮춘다, 기업간 차별이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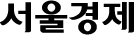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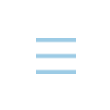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단독] 음식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안한다…첫 사례](https://newsimg.sedaily.com/2019/05/23/1VJ94D761N_2.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