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고자 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것이 시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의 꿈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안정된 현실의 꿈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고 있다. (중략) 식당업자가 낮에 건설현장에 가서 일해야 하고, 수십 년 짜장면 집을 운영하는 부부는 딸까지 동원해서 열다섯 시간 이상을 일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살고, 청과집 젊은이는 재고와 높은 임대료 걱정을 하더니 인터뷰 후에 문을 닫고 떠나버렸다. (중략)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 부부는 8년 동안 본점 배를 불려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손해를 보는 실정이어서 본전이라도 찾고 빠져나오려고 버텨보다가 마음의 병을 얻고 빚을 진 채 나앉아 있는 실정이다.’ (김지연, ‘자영업자’, 2018년 사월의눈 펴냄)
사진작가 김지연은 2년 반 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게를 찾아다녔다. ‘김밥본부’ ‘자유식당’ ‘우리슈퍼’ ‘동네내의’ ‘착한정육점’ ‘김서방네 청과’ 등 간판만 읽어도 정겹고 동화 같던 이 가게들은,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 사장님의 속내를 응시하는 순간, 처절한 생존의 장으로 변모한다. 식당 자영업자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씩 일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무지막지한 노동은 가족의 체력을 갉아먹는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시작한 이들은 주변 상권에 촘촘히 들어서는 동종업종 가게들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로열티와 월세 부담에 짓눌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의 악다구니 속에서도 우직하게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있다. 오랜 세월 숱한 굴곡을 넘으면서도 끝내 소박한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자식을 꼬박꼬박 먹여살린 가게들의 사연이 이 책 속에, 또 대한민국 골목마다 빼곡하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골목은 썰렁하다. 개업 화환이 시들기도 전에 직격탄을 맞은 가게, 기약도 없이 문을 닫아건 작고 애틋한 가게들이 걸음마다 스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건투를 빈다. /이연실 문학동네 편집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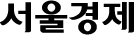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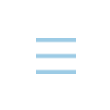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공감]어느 자영업자의 울음](https://newsimg.sedaily.com/2020/02/26/1YZ2NJHHHD_1.jpg)
![[공감]어느 자영업자의 울음](https://newsimg.sedaily.com/2020/02/26/1YZ2NJHHHD_2.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