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민운동계의 대부 같은 존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지난 1990년대 거센 세계화 물결 한복판에 있었다. 1999년 당시 국내 최대 농민조직이었던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미국 시애틀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농민 수십명을 이끌고 ‘원정투쟁’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 정도로 강성이었고 따르는 농민도 많았다. 김 사장은 “전 세계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던 그때는 정부와의 투쟁이 불가피했다. 싸워서 보상을 얻어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김 사장은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농민단체들은 대정부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품목별 전문성을 키워 정부를 능가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뼈 있는 조언을 했다. ‘식량주권’ ‘시장 개방 피해자’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정부 지원 확대만을 주야장천 요구하는 일부 농민단체를 겨냥한 것이다.
그의 경력은 이런 지적을 더 뼈아프게 한다. 김 사장은 1983년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입사하며 농업계에 발을 디뎠다. 20여년간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3년 9월 참여정부 농어촌비서관에 발탁돼 2년 반 가까이 청와대에서 일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파격적인 119조원 규모의 농업종합대책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 설득해 관철시켰다.
이후 농촌진흥청장으로 옮겨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추진했던 농진청 폐지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2009년 3월 고향인 경남 진주로 내려와 경상대 초빙교수로 10년여간 일하다 지난해 3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농업계에서는 비정부기구(NGO) 활동은 물론 청와대 비서관과 학계까지 넘나든 드문 인물이다. 지금은 제도로 정착된 자조금 사업을 낙농육우협회 전무 시절 도입해 한우·한돈 등으로 확산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정부가 전업농(경지면적 6㏊ 이상)을 홀대하고 청년을 비롯한 귀농·귀촌에만 신경 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업농들이 의타심에 젖어 있다”고 맞받았다. 김 사장은 “전업농 대부분은 과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면서 “이제는 경지면적이 없는 미래의 농업인에게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업농들이 마치 정부에 ‘청구서’ 요청하듯 지원해달라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농업은 자연과 동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농어업인들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농어촌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4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려면 물을 대고 농지를 깔아주는 농어촌공사와 함께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공사는 ‘초심’을 의미하고, 이 초심을 임기 동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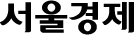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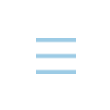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서경이 만난 사람]'농민단체, 품목별 전문성 키워 정부 능가하는 대책 내놔야'](https://newsimg.sedaily.com/2020/03/29/1Z0DZ5V50C_1.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