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호황기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벤처들이 대거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할수록 관리종목에 지정돼 증시에서 퇴출될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면서다. 일부 기업은 베이커리, 부동산 임대 등 바이오 사업과 동떨어진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10년 이상 R&D 투자가 필요한 신약 개발의 특성을 외면한 채 한국거래소가 잠재력 있는 바이오 벤처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내 재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코스닥 바이오 상장사는 10여 곳에 달한다. 바이오 투자 호황기이던 2019~2021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해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둔 기업들이다.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 30억 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등에 해당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매출 요건을 5년간, 법차손 요건을 3년간 충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는다.
이달 말까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은 올해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뒤에는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카이노스메드(284620)는 최근 미국 벤처캐피탈(VC)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이오플로우(294090)·압타머사이언스(291650) 등은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 6월 베이커리인 ‘포베이커’를 인수해 화제가 된 셀리드(299660)는 3분기 기준 법차손 비율 16%를 기록해 4분기 비용 수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법차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올리패스(244460)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경기 수원시 민간임대아파트 241세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간 매출을 내기 어려운 바이오 산업의 구조 때문이다.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개발 기간 동안 바이오 기업은 매출 없이 R&D 비용만 대규모로 지출한다. 현 제도상 이는 고스란히 손실로 잡힌다. 이에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유지를 위해 성장의 핵심인 R&D 투자를 줄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 3년 차에서 5년 차 사업연도 평균 R&D 투자액은 57억 4100만 원에서 47억 64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일반 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R&D 투자액이 같은 기간 29억 6700만 원에서 37억 8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해외 상황은 전혀 다르다. 미국 나스닥은 재무적 성과인 순이익 요건, 시장평가에 따른 시가총액 요건 또는 자기자본 요건으로 상장유지 조건을 구분하고 상장사들이 특성에 따라 맞는 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한다. 덕분에 1987년 설립 이후 15년간 적자를 보던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등을 개발하며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모더나도 2010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이익을 내지 못했다. 이외에 홍콩 증권거래소도 재무 성과를 상장 폐지와 연결시키지 않고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Growth) 시장은 상장 유지 요건으로 순자산 흑자 유지, 시가총액 40억 엔 이상만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R&D 투자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법차손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도 밝힌 상태다. 문제는 이 규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최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려면 금융위원회 소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의 상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풀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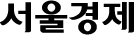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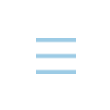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박효정 기자
박효정 기자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