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개발 기업 로켓랩의 창업자 피터 벡은 어릴 적부터 로켓광이었다. 1977년 뉴질랜드 최남단 마을 인버카길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 시절 아버지와 별 보기를 즐기며 언젠가는 직접 로켓을 만들어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 기계를 좋아했던 그에게는 차고에서 낡은 미니(Mini) 자동차를 분해한 다음 부품들을 재조립하고 터보 장치까지 달아 새 차로 만드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로켓에 매료된 벡은 대학에 가지 않고 정밀기계 회사에서 견습생 생활을 택했다. 퇴근 후 첨단 기계와 자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뉴질랜드 정부의 창업 지원 기관인 캘러헌이노베이션에 취직한 후 독학으로 로켓 연구를 이어가다 2006년에 로켓랩을 설립했다.
로켓랩은 본격적인 투자·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진출한 후 ‘제2의 스페이스X’로 불릴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민간 통신 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주선 부품 제작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프랑스 인터넷 회사 키네이스의 의뢰를 받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로써 로켓랩은 창사 이래 56번째 로켓 발사 기록을 세웠다. 300㎏ 이하의 탑재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소형 로켓 ‘일렉트론’을 앞세운 로켓랩이 첨단 발사체 ‘팰컨9’을 갖춘 스페이스X의 독점 체제를 허문 셈이다.
로켓랩은 실적도 급성장해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억 4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다. 로켓랩의 강점은 부품 제작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로켓 발사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촌뜨기’였던 벡에게 선뜻 납품을 해줄 회사가 없었기에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이 경쟁력의 원천이 됐다. 한 분야에 심취한 괴짜 벡의 성공 사례는 인재들이 의대에만 몰리는 한국에서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창의적 도전가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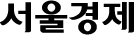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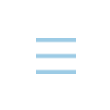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만파식적] 로켓랩](https://newsimg.sedaily.com/2024/12/03/2DHZ8EFI01_1.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