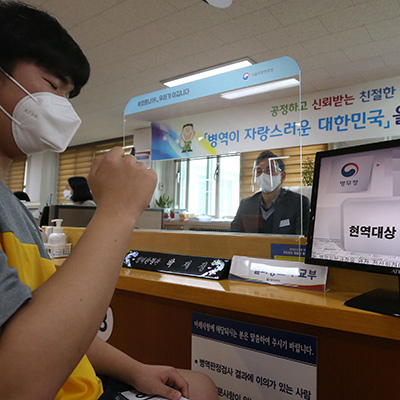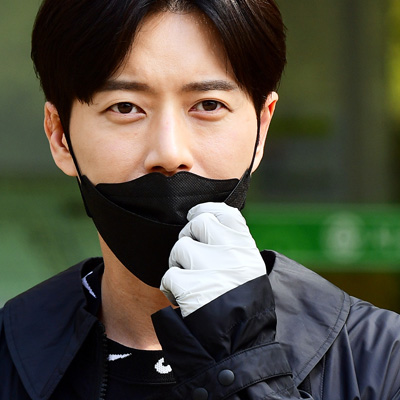|
정부가 철강 업계 설비 조정의 대상으로 철근을 콕 찍은 것은 현대제철(004020)과 동국제강(460860) 등 주요 철근 생산 업체들의 감산 조치만으로는 혼란에 빠진 철근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철강 업체들은 이미 대표적인 범용재인 철근 생산량을 2년 만에 200만 톤 넘게 줄였지만 여전히 철근 유통가격은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을 한참 밑돌고 있다. 올해 철근 수요는 3년 전보다 30% 줄어든 71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1300만 톤인 국내 철근 생산 설비 중 최대 절반은 줄여야 생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철근은 779만 6811톤이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999만 337톤에서 200만 톤 넘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1~8월 철근 생산량은 422만 9889톤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생산 규모는 714만 톤 정도로 예상돼 철근 생산량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철근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것은 건설경기 등 전방 수요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철근 생산 1위 업체인 현대제철과 2위인 동국제강의 철근 공장 평균 가동률은 최근 60% 내외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주간에는 철근 생산을 멈춘 채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야간에만 철근을 생산하는 고육지책을 한참 전부터 시행 중이다.
두 업체는 이 같은 조치에도 철근 시장이 회복되지 않자 셧다운이라는 강수까지 뒀다. 현대제철은 4월 한 달간 연산 155만 톤의 인천 공장 가동을 멈췄다. 현대제철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 시설 보수를 명목으로 전체 철근 공장을 멈춰 세웠다. 동국제강 역시 단일 공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공장(연산 220만 톤)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셧다운했다. 동국제강이 인천 공장을 셧다운한 건 1972년 첫 가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
문제는 이 같은 자구책에도 철근 시장의 수급이 정상화되지 않고 공급과잉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78만 톤으로 2021년 1123만 톤보다 30.7%나 줄어들었다. 올해 국내 철근 수요 추정치는 710만 톤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도 적은 600만 톤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한다.
이에 국내 철근 유통가격(범용 제품인 SD400·10㎜ 기준)은 이달 기준 톤당 68만 원으로 손익분기점인 75만 원을 한참 밑돌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 성수기로 보는 5월에도 철근 가격은 톤당 75만 원 수준에 그쳤으며 1~2위 철근 업체가 공장 문을 닫은 8월에도 가격은 오히려 톤당 71만 원까지 떨어졌다. 만들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철근의 전방 수요처인 건설 경기의 불황이 깊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착공 면적은 7931만 ㎡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7519만 ㎡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착공 면적인 1억 1800만 ㎡의 67%에 불과하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근 생산에 대한 기술장벽이 낮다 보니 국내 건설 시장이 활황을 보이던 시기 철강 업체들은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경쟁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충했다”면서 “공급과잉이라는 구조가 해결되지 않아 업체들의 자발적인 생산 감축과 인위적인 가격 인상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닥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 철근 생산 설비의 절반을 줄여야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연간 철근 생산 능력은 1300만 톤에 이른다. 올해 국내 철근 수요가 600만 톤 대까지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현재 설비의 절반을 감축해야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 업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이 동반돼야 적극적인 설비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철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이미 모두 사용한 상태”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야 보다 적극적인 설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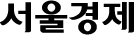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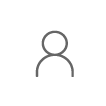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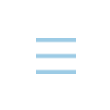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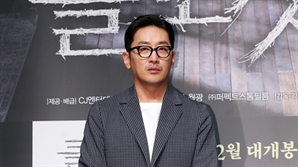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