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의 진심이 통했다.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이 없던 한 사람. 수사기록에 증거로만 존재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범에게 희생되기 전, 누군가의 딸, 그리고 아들 또는 엄마였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이야기에 대중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
지난 3일 개봉해 300만 관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제작 필름295)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 태오(주지훈 분)와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 형민(김윤석 분)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김정수 형사 실화를 모티프로 했다.
집요하면서도 담담한 심리전이 핵심인 ‘‘암수살인’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감옥에서 온 퍼즐’ 편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다.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인 김정수 형사를 직접 만나 약 6년간 취재 끝에 재구성했다. 감독은 ‘피해자가 있고 유족이 있으니 한다’ 말한 김정수 형사의 태도를 보고 ‘이 영화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22년차 베테랑 형사인데, 만났을 때 첫인상부터 강력계 형사의 전형적인 모습과 달랐다. 재킷 차림에 사람을 대하는 예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집념이 느껴졌다. 세상에 이런 형사가 있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형사와 영화 속 형민의 공통점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와 철학, 관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 형사가 담담하고 세밀하게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영화. 애초 김태균 감독 역시 이런 형사가 ‘실제로 있을까?‘하는 의심을 먼저 가졌다고 했다. 그래서 감독이 실제 형사에게 첫 질문했던 건 “형사님 진급도 안 되는데, 이 일을 왜 해요?” 였다.
“궁금했던 부분을 다 질문했다. 그랬더니 ‘피해자 때문에 한다’ 고 말씀하시더라. 유족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그리고선 ‘사람 마음에 공소시효가 어디있냐’고 되물으셨다. 공소시효라는 게 법치의 효율성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공소시효가 끝나면 사건이 끝난다는게 자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진급이나 이런 것에 관심 없다는 말과 함께”
“이 분이 다른 형사와 결이 다르구나란 걸 느꼈다. 사안을 바라볼 때,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분인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물론이지만, 사건이 클로징이 안되면, 피해자의 삶이 무너진다. 피해자를 찾아야 증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형사의 얘기를 꼭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영화 속에선 믿음이 가는 형사가 등장한다. 유연하지만 안에 단단한 심이 있는 형사이다. 형사들이 꼽은 형사 역 1위라는 찬사를 얻은 배우 김윤석이 제 몫을 제대로 해낸다. 감독은 형사 역으로 내면에 용광로를 지닌 김윤석 배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
|
“구조적으로 범인을 잡는 영화가 아니다. 살인범은 이미 잡혀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는 영화다. 자칫하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객과 싸움에서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전에서도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배우가 필요했다. 범인과의 심리전에서 유린당하더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집념의 배우 말이다. 그게 저에겐 바로 김윤석 배우였다. ”
‘암수살인’은 이미 수감된 살인범의 자백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찾고 살인범의 범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영화다. 끝까지 사건에 집중하는 형사가 엔딩을 위해 달려간다. 무엇보다 장르적인 관습이나 결말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점이 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한다.
“좀 더 장르적으로 결말을 만들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본질을 훼손하면서 영화를 찍자는 아이디어를 아무도 내지 않았다. 상업적으로 흥미를 추구하기 보단 애초 의도대로 담백하게 가기로 했다. ”
“사실 이런 결말을 선택하는 게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작자, 투자자, 주연배우 등이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영화는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다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본 영화다. 그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복이다. 영화를 함께하는 모두가 공감을 하니 같은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었다.”
|
‘암수살인’은 결국 무관심이 만든 비극임을 이야기한다. 감독은 “영화가 단순히 형사와 범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형사는 사건 해결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었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요. 그게 결국 울림을 줘요. 이 울림이 잘 전달이 돼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해요. 우리가 아무도 상관없는 섬처럼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다 연결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의 함의가 사회적으로 환기가 돼서 ‘암수범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것도 다 제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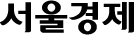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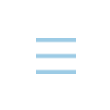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SE★인터뷰] ‘암수살인’ 감독, “‘암수(暗數) 범죄’..무관심이 낳은 비극”](https://newsimg.sedaily.com/2018/10/17/1S5Y52PZ52_1.jpg)
![[SE★인터뷰] ‘암수살인’ 감독, “‘암수(暗數) 범죄’..무관심이 낳은 비극”](https://newsimg.sedaily.com/2018/10/17/1S5Y52PZ52_2.jpg)
![[SE★인터뷰] ‘암수살인’ 감독, “‘암수(暗數) 범죄’..무관심이 낳은 비극”](https://newsimg.sedaily.com/2018/10/17/1S5Y52PZ52_3.jpg)
![[SE★인터뷰] ‘암수살인’ 감독, “‘암수(暗數) 범죄’..무관심이 낳은 비극”](https://newsimg.sedaily.com/2018/10/17/1S5Y52PZ52_4.jpg)
![[SE★인터뷰] ‘암수살인’ 감독, “‘암수(暗數) 범죄’..무관심이 낳은 비극”](https://newsimg.sedaily.com/2018/10/17/1S5Y52PZ52_5.jpg)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