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교동 178-1번지에는 문패 두 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 하나는 ‘김대중(金大中)’, 하나는 ‘이희호(李姬鎬)’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출간한 자서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에서 “우리 집은 30년 전부터 아내와 나 두 사람의 문패가 나란히 붙어 있다”며 “이것은 아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름대로 여권 존중의 심정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 역시 2008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다른 집에 내외 문패를 다는 곳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일 것”이라며 “그 만큼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하고 동행하면서 살아 왔다”고 밝혔다.
결혼 이듬해인 1963년부터 늘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걸린 문패처럼 두 사람은 평생의 동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 여사에 대해 “가장 어려운 시대를 나와 함께 투쟁해 온 사람”이라며 “아내와 나의 관계는 부부이기 이전에 동지라는 편이 옳은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감옥에 가고 연금 당하고 망명 생활을 하느라 집안을 돌볼 수 없었을 때, 아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족들을 잘 돌보며 나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정치적 동지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생전 이 여사는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남편이 감금된 상태에서 라디오를 통해 남편의 사형선고를 들었을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1980년 신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해 김 전 대통령 등 재야 인사들을 잡아들인 후 내란 음모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했던 때를 꼽은 것이다.
이 여사는 당시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질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는 내색하지 않았고, 옥중으로 600권의 책을 보내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남편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 함께 1982년 말 미국으로 망명해 한국의 독재 실상을 현지에 알렸고 1987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1987·1992·1997년 대선을 함께 치렀다.
|
이 여사는 정치인 김대중을 내조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 변화에도 늘 앞장 섰다. 김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부터 여권 신장 운동에 헌신했던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여성 뿐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 권익 신장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여사가 영부인이 된 후 가장 먼저 가진 직책은 결식아동을 돕는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의 명예회장이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2000년 같은 해 펄 벅 인터내셔널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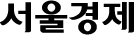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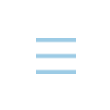
 정영현 기자
정영현 기자
















![학폭의혹 김유진PD·강승현 '사실을 떠나' 사과or반박, 모두 '후폭풍'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L47NQVD_GL_119686_m.jpeg)
![[SE★현장] 최강희X김지영X유인영 '굿캐스팅'? 아니죠 "레전드 캐스팅입니다"(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OPGULE_GL_119657_m.jpeg)



![[Mr.쓴샤인]'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 해야 할 것 같은데](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929W93_GL_119628_m.jpg)
![[SE★현장]'K-밥 스타' 김숙X이영자 "다이어트에 지친 아이돌, 우리에게 오라"(종합)](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NFPJQ_GL_119626_m.jpeg)
!["6만6천원에 모십니다" 은퇴 번복 박유천, 팬클럽 가입비·화보집 논란[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K89DCS9_GL_119627_m.jpeg)

![[SE★VIEW]'더 킹-영원의 군주' 출발은 약했다…'김은숙의 힘' 입증할까](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H2I25_GL_119582_m.jpg)
![[SE★현장]'본 어게인' 진세연 "대본 아니라 소설 읽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SG1C28_GL_119585_m.jpeg)

!["가방사주면 애인해줘?" 언제적 이야기…'부부의 세계' 폭행·성성품화 논란 [SE★이슈]](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4/1Z1JR617X9_GL_119571_m.jpg)





















